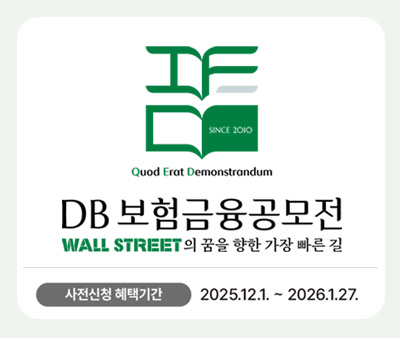[캠퍼스엔/권예인 기자] 최근 한국 대중문화가 부흥기를 맞았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BTS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수의 트로피를 거머쥔 영화 기생충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대중에게 다가간다. 그러나, 부흥기에서 허물어진 것은 국경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 세대 간 차이를 넘어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세대 차이란 사전에 따르면 세대가 다른 집단 간 경험에 따라 다방면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대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를 일컫는다. 예컨대, 각 세대는 음악과 매체라는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자녀 세대는 팝과 힙합을, 부모 세대는 흔히 ‘성인가요’라고도 하는 트로트 등의 옛 노래를 듣는다. 매체에 있어서 자녀 세대는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신생 sns를 사용하고, 부모 세대는 ‘band’를 사용하는 등 같은 영역 안에서 향유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문화적 세대 차이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중문화는 어떻게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있을까? 최근 인기를 끈 ‘미스 트롯’과 ‘미스터 트롯’은 흔히 어른들의 문화라 여겨지는 ‘트롯’을 대상으로 했다. 5060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트로트가 최신 예능의 서바이벌 포맷과 만나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탄생한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대국민 투표, 스트리밍, 방청 등의 응원 문화는 또한 팬덤 문화와 연결된다. 1020 세대가 주축이던 팬덤 문화에 문외한이던 부모 세대가 등장했다. 그들은 자녀 세대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팬이 되어 간다. 또한, 트롯이라는 장르에 자녀 세대가 유입하며 부모 세대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조금 새로운 모습인, 트로트를 듣는 젊은 세대와 문자 투표를 하는 부모 세대가 대중문화 측면에서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서로의 영역을 교환하듯이 문화는 세대를 넘나들었다.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3년 국내에 들어온 ‘대중문화’라는 단어는 1960년대 도시화와 영상 매체의 발전을 따라 본격적으로 상용됐다. 그러나, 1970-80년대에 들어서는 대중 매체가 부정적 존재로 다가왔다. 이데올로기 시대 속 매체는 계급성을 띠었다.
그 후, 1990년대부터 ‘한류’가 시작되며 현재까지도 사람들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창조자의 역할로서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서브 컬쳐, 즉 부차적이고 하위에 있는 것이라 여겨지던 문화가 반대되는 개념인 주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당시 대중문화가 저급 문화였던 것은 대중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며 상업주의에 영향을 받고 쾌락만 추구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한 인식이 소비하는 세대 간의 간극을 더 커지게 했다.
문화는 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더욱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며 스테레오 타입을 타파했다. 결국 그 점이 모든 세대를 설득한 것이다. 대중문화를 즐기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모습”이라고 놀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있어 그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 일 수 있다.
이 또한 문화의 역할이다. 각 세대가 대중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어쩌면 대중문화에 대한 작은 인식 변화가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닐까. 그러한 역방향의 기폭제가 된 것이 최근 한국 대중 문화의 흐름이다.